[그래도 실험실이 좋습니다] 기록이 쌓여서 연구가 된다
학창 시절부터 다이어리와 노트 필기에 관심이 많았다.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나, 한창 공부블로그가 유행하던 시기였는데 유행한다는 볼펜과 형광펜을 따라 구매하고 나름 과목마다 노트필기를 열심히 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 버릇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했다. 다이어리나 수첩을 매년 마련하지 않으면 한 해가 불편했고, 사소한 것까지 메모했다. 그 습관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리고 그 습관이 내게 많은 도움을 준 것은 다름 아닌 실험실에서였다.

연구와 기록은 뗄 수 없는 관계다. 고등학생 때, 과학실험 동아리를 하면서 처음으로 실험 보고서를 작성했다. 실험 보고서는 간단했다. 실험 전 보고서, 실험 계획, 실험 결과, 고찰. 항상 고찰을 어려워했다. 실험 결과를 가지고 의견을 정리해서 기록하는 것인데 객관적인 나의 의견과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하라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얼마나 애매모호한지. 실험하면서 느낀 점마저도 실험 보고서에 적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과학동아리 활동을 한 2년 동안 점차 나아졌었다. 이후 대학생이 되어서는 실험 보고서는 가볍게 해치울 수 있었으니.
이후에 연구노트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학부생 졸업논문을 준비하면서 연구노트를 쓰는 방법을 배웠다. 처음 들어갔던 실험실은 대장균을 이용한 실험실이었다. 당시 학부생이던 내 기준에 굉장히 어려운 연구를 진행하는 곳이었는데, 그러했기에 선배들에게 아주 제대로 배울 수 있던 곳이었다. 선배들은 연구노트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기록하고 스크랩하기를 원하셨는데 덕분에 그림부터 실험 데이터까지 연구노트를 자세히 쓰는 방법을 이 연구실에서 익힐 수 있었다.
아직까지 지키고 있는 몇 가지 기준은 모두 그 실험실에서 배웠던 내용이다. 다음 날에는 무조건 새로운 페이지에서 시작할 것, 오른쪽 페이지에는 기록을 왼쪽 페이지에는 기본적으로 비워둔 채 데이터나 참고할 자료를 풀로 부착할 것, 무조건 볼펜을 사용하여 기록하고, 화이트를 사용하지 말 것, 사용하는 볼펜의 색은 최대 세 가지로만 사용하고,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추가할 것.
잘 쓴 연구노트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보통 연구노트는 과제와 관련된 경우 해당 연구실에서 보관하고 개인적으로 가져올 수 없었지만, 학부생 때 졸업논문을 준비하면서 작성했던 연구노트는 개인적으로 가져올 수 있었다. 당시에 본격적으로 졸업논문을 작성한 연구실은 신임교수님의 방이었는데 실험실 세팅을 하면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연구노트로 작성했다. 졸업논문을 쓰러 들어온 언니 둘과, 나와 동기 한 명, 그리고 남자 선배 한 명과 후배 한 명. 이렇게 초짜 학부생들이 모여있던 곳에서 졸업논문을 작성했다. 여기 쓰기 민망한 얘기지만 당시에는 대학원 진학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졸업논문을 위해 1년 이상 투자하는 과정이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당시 아주 간단한 실험들과 세팅, 그리고 실험실의 기초 운영을 가장 많이 담당했다. 소모품을 관리하고 세포의 기본 배양을 하고, 자취를 했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도 일이 생기면 실험실에 가서 확인했다. 그 모든 과정에서 기기의 사용법, 소모품 준비법, 세포 배양, 배지 제조, 기기 운용 등의 다양한 기록을 연구노트에 빼곡히 작성했다. 졸업논문은 같은 주제를 연구한 동기가 조기졸업을 하면서, 내가 회사로 인턴과정을 나가게 되어 취업계를 쓰면서 많은 과정을 생략하고 마무리되었지만 그 당시 실험실을 셋업 하면서 작성한 연구노트는 추후 회사에 가서나 대학원에 입학해서도 가끔 찾아보는 하나의 설명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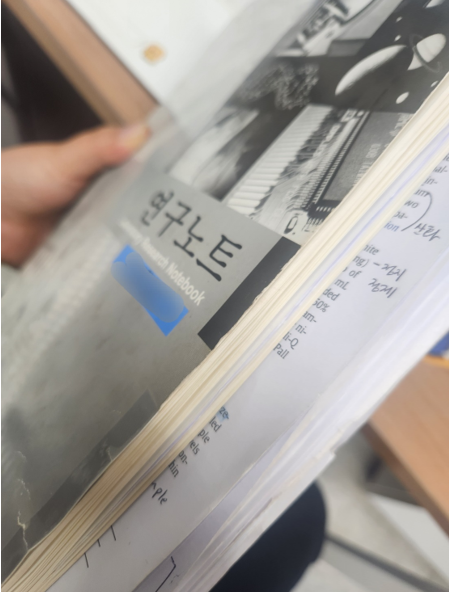
연구소에서 일을 하면서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일은 거의 없었다. 회사였다 보니 주로 컴퓨터로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였고, 연구노트보다는 개인적으로 시럼 결과를 기록해서 다시 엑셀에 옮기는 과정이 주가 되었다. 하지만 원래도 다이어리나 수첩에 필기하는 것을 좋아했고, 더불어 연구노트를 작성했던 경험이 있었던지라 끊임없이 업무와 실험에 대한 기록을 계속했다. 마음 한구석엔 처음 해보는 일이 많았기에 하나라도 잊어버리거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세히 기록을 했었다. 연구노트와는 다른 기록들이 또 시간이 지나는 만큼 쌓여갔다.
대학원에 진학한 후로도 다시 연구노트를 작성했는데, 아무래도 연구량이 늘어나다 보니 2-3일 치 분량을 하루에 몰아서 기록하는 일도 번번이 일어났다. 초창기에는 박사 선배의 검사를 받았었지만, 나중에는 오롯이 혼자 기록하는 몫이 되었다. 엑셀을 사용하고 R을 사용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손으로 기록하는 것만큼 머릿속으로 정리되는 방법이 없었다.
이상하게도 기록을 하면서 더 남는 것이 많아졌다. 배우는 것이 많아질수록, 새로운 것들을 많이 기억해야 할수록, 반대로 적지 않으면 까먹는 것들이 점점 많아져서 병적으로라도 적게 되었던 것 같다. 그렇게 쌓인 기록들은 연구의 발판이 되었던 것 같다. 연구는 시험결과를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하느냐에서부터 판가름된다는 걸 깨달았다. 무엇보다 매일 적어 쌓였던 연구노트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보람찬 결과물이 없었다. 권수가 늘어갈수록, 논문이나 보고서를 쓸 때 연구노트를 찾거나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내 연구노트를 참고하는 상황이 있을수록 점점 발전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 조금 귀찮아도 기록을 소홀히 하지 말자. 기록은 힘이 있다.
본 기사는 네티즌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기관에서 작성된 보도자료로, BRIC의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내용 중 개인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사실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BRIC(ibric.org) Bio통신원(김틸다(필명)) 등록 2024.08.28